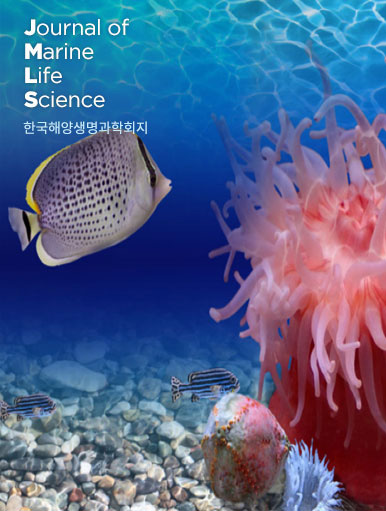서 론
해양생물의 생식생태에 대한 연구는 기초생물학, 생물자원의 보존, 관리 및 양식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선 성비, 군성숙도, 포란수, 생식잠재력, 생식주기, 주 산란기 등을 구명해야 한다(Park et al., 2022). 이러한 생식지표 가운데 생식잠재력은 개체가 생산할 수 있는 총 자손의 수를 의미하며, 해양생물의 개체군 유지와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Bagenal and Brown, 1978;Campbell and Robinson, 1983;Kjesbu and Holm, 1994;Goni et al., 2003;Tallack, 2007;Cooper et al., 2013).
두족류는 정자를 정포의 형태로 저장한 후 교미 시 암컷에게 전달하는 특이적인 생식전략을 가지기 때문에 두족류의 생식잠 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포란수와 함께 수컷 생식기관 내의 정포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Kanciruk and Herrnkind, 1976;Silva et al., 2002;Chang et al., 2007;Cuccu et al., 2013).
참문어 Octopus vulgaris는 극지방을 제외한 전세계 온대 및 열대 해역에 분포하며, 한국, 일본, 지중해 국가 등에서 주요 수산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Guerra, 1997;Hastie et al., 2009;Song et al., 2020).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두족류 자원으로 산업적 중요성이 크지만, 문어류의 생산량은 2010년 10,813톤, 2015년 8,753톤, 2023년 8,283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KOSIS, 2024).
문어과의 생식생태에 대한 연구는 Eledone moschata (Šifner and Vrgoć, 2009), O. cyanea (Raberinary and Benbow, 2012), 문어 O. dofleini (Lee et al., 2014), O. hubbosorum (Pliego-Cárdenas et al., 2011), O. insularis (de Lima et al., 2014;González-Gómez et al., 2020), 낙지 O. minor (Kim et al., 2017), 주꾸미 O. ocellatus (Kim et al., 2001;Wang et al., 2015), 참문어(Kim et al., 2008;Lourenco et al., 2012;Song et al., 2020;Yang et al., 2021) 등을 대상으로 포란수, 생식주기, 군성숙도 등에 관해서 수행되었지만, 생식잠재력에 대해 암컷과 수컷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Silva et al., 2002;Cuccu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참문어의 자원 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비, 군성숙도, 포란수 및 정포수를 분석하여 개체군 수준의 생식잠재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참문어 Octopus vulgaris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한국 남해안 여수 인근 해역(34°31'-34°35'N, 127°43'-127°47'E) 및 완도 인근 해역(34°04'-34°25'N, 126°27'-127°37'E)에서 문어단지 및 통발을 이용하여 전중 64.5-1,598.5 g (전장 444.2±97.9 mm, 전중 462.2±302.1 g), 1,821개체를 채집하였다(Fig. 1).
2. 수온
채집지역의 수온 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KHOA, 2023)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하였다.
3. 성비
성비(암:수)는 암컷에 대한 수컷의 비와 전체 개체수에 대한 암컷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냈으며, 전중 100.0 g 구간으로 구분하여 계급구간별 성비를 확인하였다.
4. 군성숙도
군성숙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조직표본 관찰을 통해 생식소발 달단계는 비활성기, 초기활성기, 후기활성 및 성숙기, 완숙기, 방출 및 퇴화기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성숙여부는 후기활성 및 성숙기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Fig. 2B-D).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용하여 50%, 75%, 97.5% 성숙 전중을 분석하였다.
5. 포란수 및 정포수
포란수는 생물학적 최소형 이상의 개체를 분석하였다. 포란 수는 완숙단계의 난소를 절개하여 완숙난을 분리한 후 중량법 (Bagenal and Brown, 1978)으로 분석하였다(Fig. 2A).
F: 절대포란수, A: 난소 중량(g), B: 난소 외막의 중량(g), C: 분석 난소의 중량(g), e: 분석 난소(C)의 난 개수
상대포란수는 전중 1 g에 대한 포란수를 분석하였다.
정포수는 수컷 정포낭 내의 정포를 계수하여 절대정포수와 전중 1 g에 대한 상대정포수를 분석하였다(Fig. 2E-G).
6. 유의성 검증
본 연구에서 성비는 SPSS 통계 프로그램(SPSS 24.0, SPSS Inc., Microsoft Co., WA)을 이용하여 χ2 (Chi-square) t-test를 통해 유의성 여부를 판정하였다(p<0.05).
결과
1. 수온
여수 인근 해역의 평균 수온은 16.7±6.5℃ (7.0-25.7℃)였 으며, 2023년 8월에 25.7℃로 가장 높았고, 2023년 1월에 7. 0℃로 낮았다. 완도 인근 해역의 평균 수온은 15.9±5.0℃ (8.7-25.4℃)였으며, 최고 수온은 2023년 8월에 25.4℃였고, 최저 수온은 2023년 1월에 8.7℃였다.
2. 성비
성비(암:수)는 1,821개체 가운데 암컷 1,001개체, 수컷 820 개체였으며, 성비 1:0.82로 암컷의 비율(55.0%)이 유의하게 높 았다(p<0.05, Table 1). 여수 개체군에서는 1:0.79 (암컷 55.9%)였으며, 완도 개체군에서는 1:0.84 (암컷 54.5%)로 두 지역 모두 암컷의 비율이 높았다.
3. 군성숙도
암컷의 성숙도는 전중 100.0 g 이하 구간에서 22.2%, 100.1-200.0 g 구간에서 61.5%, 600.1 g 이상 구간에서 8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수컷은 전중 100.0 g 이하 구간에서 33.3%였으며, 100.1 g 이상 구간에서 모두 90.0% 이상의 성숙도를 보였다(Table 2). 로지스틱 식에 의해 분석된 암컷의 50% 성숙 전중은 169.3 g이었으며, 75%, 97.5% 성숙 전중은 각각 485.7 g, 1,224.3 g이었다(Fig. 3).
4. 포란수
절대포란수는 21,266-250,433개의 범위였으며, 평균 116,602.7개였다. 계급구간별 절대포란수는 전중 200.1-300.0 g 구간에서 31,338.3개, 전중 500.1-600.0 g 구간에서 68,174.5개, 1,000.1-1,100.0 g 구간에서는 116,809.7개, 1,500.0 g 이상 구간에서는 171,408.9개로 나타났다. 포란수(F)와 전중(TW) 과의 관계식은 F=135.6TW0.9721 (R2=0.7232)로 전중이 증가함에 따라 포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3, Fig. 4).
상대포란수는 전중 g당 평균 123.8개로 나타났으며, 전중 200.1-300.0 g 구간에서는 123.6개, 전중 500.1-600.0 g 구간에서 124.4개였으며, 700.1-800.0 g 구간에서 157.6개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후 그 이상의 개체구간에서는 130.0개 이하의 값을 보였다(Table 3).
5. 정포수
참문어의 수컷 생식기관은 정소, 일차수정관, 일차정포선, 이차정포선, 이차수정관, 정포낭 및 정포배출관으로 구성된다 (Kim, 2025). 두족류에서 정포는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수정관, 정포선을 거쳐 형성되며(Drew, 1919), 이후 정포낭 내강에 보관된다.
정포낭 내부에는 길이 91.4 mm, 폭 0.4 mm의 가늘고 긴 곤봉 형태의 정포들로 채워져 있었다(Fig. 2E-G). 절대정포수 는 5-481개의 범위였으며, 평균 123.9개였다. 계급구간별 절대정포수는 1,500.0 g 이상 구간에서 173.3개로 가장 높고 100.1-200.0 g 구간에서 55.9개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전중 100.1-200.0 g 구간에서 55.9개, 전중 500.1-600.0 g 구간에서 104.6개, 1,000.1-1,100.0 g 구간에서는 159.5개로 나타났다. 정포수(F)와 전중(TW)과의 상관관계는 F=0.0608TW +71.524 (R2=0.0808)로 나타났으며, 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정 포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4, Fig. 5).
상대정포수는 전중 g당 평균 0.23개로 나타났으며, 100.1- 200.0 g 구간에서 0.31개로 가장 높고 800.1 g 이상 구간에서 0.15개 이하의 값을 나타냈다(Table 4).
고 찰
해양동물의 동일 개체군에서 성비는 개체군 크기의 변화 예측과 성에 따른 성장 차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생식생물학적 지표로 활용된다(Park et al., 2022). 참문어의 성비는 지역적 차이를 보이며, 동일 개체군에서는 개체 크기 및 시기에 따라 성비의 차이를 보인다. 참문어 Octopus vulgaris의 성비는 카디스만에서 1:1.06 (Silva et al., 2002), 통영과 사천 연안에서 0.48:0.52 (Kim et al., 2008) 및 0.45:0.55 (Song et al., 2020), 여수 연안에서는 1:1.02로 유사하였다(Yang et al., 2021). 그러나, 제주 해역에서는 0.8:1 (Han et al., 2022)로 수컷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갈라시아 연안에서는 1:0.88 (Otero et al., 2007)으로 암컷의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성비는 1:0.82로 암컷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군성숙도는 자원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어획금지 크기 설정의 근거로 활용된다(Kang et al., 2009;Head et al., 2016;Jakobsen et al., 2016). 군성숙도를 추정하기 위한 생물학적 지표 분석에는 형태학, 해부학, 조직학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형태학 및 해부학적 방법에 의한 결과 분석은 중대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조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생식소 발달 및 성숙도를 분석하는 과정과 결과의 해석 과정에서도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Head et al., 2016), 이러한 사례는 개조개 Saxidomus purpuratus (Kim et al., 2018), 갈치 Trichiurus japonicus (Shin et al., 2023)에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참문어의 50% 성숙 전중은 169.3 g이었으며, 75% 및 97.5% 성숙 전중은 각각 485.7 g, 1,224.3 g로 나타났다. 이는 통영과 사천 연안에서 919.6 g (Kang et al., 2009) 및 636.4 g (Song et al., 2020), 여수 연안에서는 554.5 g (Yang et al., 2021), 제주 해역에서는 암, 수 각각 554.7 g과 330.6 g로 차이를 보였으며(Han et al., 2022), 이러한 차이는 성숙개체의 기준과 평가 방법의 차이로 판단된다. Kang et al. (2009), Song et al. (2020) 및 Yang et al. (2021)의 보고에서는 전체 개체에 대한 조직학적 관찰을 통해 미숙, 중숙, 성숙, 완숙의 4단계로 구분하고 성숙단계 이후를 성숙개체로 판단하였다. Han et al. (2022)에서는 950개체 중 300개체를 조직학적 분석을 통해 미발달기, 발달기, 성숙기, 완숙기, 산란기, 산란후기의 6단계로 구분하여 성숙기 단계 이후를 성숙개체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기활성 및 성숙기 이후의 개체를 모두 성숙개체로 판단하였다. 난모세포의 크기, 세포질의 호산성 과립 관찰 등의 완숙 난모세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난모 세포가 후기활성 및 성숙기 단계에서도 관찰되며, 이 단계에서의 난모세포는 성숙 시작을 나타내는 지표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방출 및 퇴화기는 산란이 이미 시작된 시기로 성숙단계로 판단하였다.
포란수는 암컷의 산란 규모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생물자원량 가입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Bagenal, 1978;Kjesbu and Holm, 1994;Jakobsen et al., 2016). 본 연구에서 참문어의 절대포란수는 21,266-250,433개로 기존 보고와 유사 하였다(Kim et al., 2008;Kang et al., 2009;Yang et al., 2021). 반면, 카디스만의 개체군에서는 70,060-605,438개 (Silva et al., 2002), 갈라시아 연안에서는 12,861-634,445개 (Otero et al., 2007), 사르데냐 주변 해역에서는 202,518- 546,662개(Cuccu et al., 2013)로 본 연구에 비해 높았으나, 상대포란수는 카디스만의 개체군에서 94.59-110.83개로 유사 하였다(Silva et al., 2002).
또한, 포란수는 종 간 차이를 보였으며, 소형 문어류인 주꾸미 O. ocellatus와 낙지 O. minor는 각각 285-669개와 44-179개(Kim et al., 2001;Kim and Kim, 2006), 대형 문어류인 문어 O. dofleini는 9,045-148,682개(Lee et al., 2014)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참문어는 소형 문어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포란수를 보였다. 대부분 문어과에 속하는 종들은 부리 (beak)가 형성된 상태로 부화하는데, 부화 소요 시간은 종에 따라 다양하다(Nixon, 1988). 기존 보고에 따르면 부화 소요 시간은 수온 20℃ 이상에서 참문어 20-60일(Mangold and von Boletzky, 1987), 낙지 72-89일(Zheng et al., 2014), 주꾸미 33일(Jiang et al., 2020)로 보고되었다. 성숙난의 크기는 참문어 약 1.7 mm, 낙지 약 18.1 mm (Kim et al., 2017), 주꾸미 약 10.1 mm (Chung et al., 2004)로 나타났다. 이는 난의 크기와 부화 소요 시간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부화 소요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난황을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난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포수는 문어과에서 수컷의 생식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참문어의 절대정포수는 5-481개, 상대정 포수는 전중 g당 평균 0.23개로 갈라시아 연안에서는 39-633개, 평균 182개였으며(Otero et al., 2007), 사르데냐 주변 해역에서는 30-246개, 평균 150개(Cuccu et al., 2013)로 유사하였다.
생식잠재력 평가에 사용되는 포란수와 정포수는 종의 생태적, 환경적 적응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서식환경이 유사한 경우에는 개체 크기, 채집시기 등의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생식잠재력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개체 크기에 따른 정포수, 난모세포 수 등의 정량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식생태학적 기초자료는 자원 관리 및 종 보존 전략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